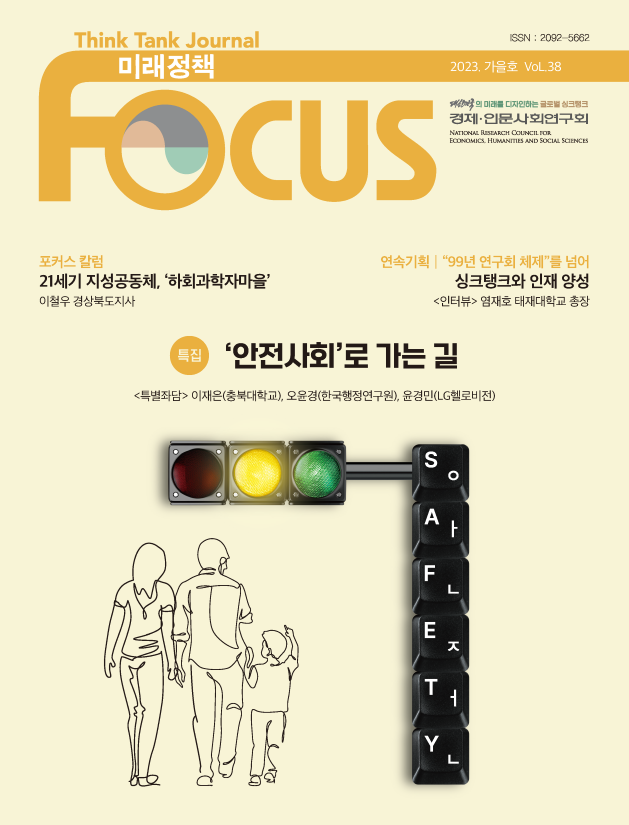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중국사회과학원과 2005년부터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본 포럼은 2013년도 외교부의 ‘인문유대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2022년부터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싱크탱크 대화’라는 부제를 달고 양 국가 간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교류·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23년도에 제16회를 맞이한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은 4년 만에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제16차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의 대주제는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융합발전’으로 기조발제와 3개의 세션으로 이어졌다. ‘과학기술의 현대화와 인간 사회의 변화(과거 현상)’, ‘디지털시대 인문학의 탐색과 경험(현재 사례)’, ‘디지털시대 인문학의 미래적 역할과 가치(미래 혁신)’이라는 각 세션 주제 아래 양 국가의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인문학 변화의 필요성과 새롭게 도래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학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하며 양 국가의 과거 경험, 현재 대처, 다가올 미래에 대해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종일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행사는 줄곧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디지털 기술에 인문학으로 대응해야
먼저 기조연설로 하성량 중국사회과학원 민족학과 인류학연구소 교수가 ‘AI 혁명과 동방문명’을, 이종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가 ‘디지털 전환과 인간: 뇌 과학과 생성AI의 도전 속 인간’을 각각 발표했다. 하성량 교수는 서방의 분석적 사유는 산업혁명 중의 물질적 에너지 논의에 도움이 되는 반면 동방의 전체적 사유는 AI 혁명 중의 지적 에너지를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관 교수는 뇌 과학, 생성형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 시대에 물질을 가상화하기보다 비물질적 창조 감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1세션에서 강정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디지털 사회 전환: 근거기반 의사결정과 탈진실 시대의 공존과 윤리적 함의’를, 채약주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기술연구소 교수는 ‘새로운 기술혁명하의 디지털경제 및 중국의 탐색’에 관해 발표했다. 강정한 교수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탈진실’을 초래한 배경에는 정보량의 폭발적 팽창이 놓여 있다. 오늘날 어떤 한 개인도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검토해 평가할 능력이 없다. 요컨대 생산되는 정보량이 처리 능력을 초과한 지 한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정보를 선별 수용하거나 혹은 누군가(기계일 수도 있다)가 선별해준 정보를 거의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공론장의 붕괴는 디지털 심화 사회에서 이처럼 필연이다. 확증편향, 필터 버블, 동굴효과, 자기완성적 진실, 위조뉴스, 인포데믹 등은 이런 상황을 지칭하는 객관적 용어이며 ‘탈진실’이나 ‘대안사실’은 이 상황의 구체적 요소다. 강 교수는 데이터에 서사를 보태 ‘근거’를 확보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데이터 자체가 양분되어 반대되는 서사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방류수(오염수, 처리수)를 둘러싼 ‘과학적 진실’ 논란도 이 자장에 있는 듯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데이터의 지위란 무엇일까?
인문학이 디지털 전환하면
제2세션에서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교수는 ‘디지털 시대, 인문학 활동의 디지털 전환–한국의 사례: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는 문화유산 3D 디지털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로 건조물뿐 아니라 사람의 삶과 역사를 디지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환경의 인문학 활동’의 사례다. 이런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작업은 챗GPT 같은 초거대 언어모델(LLM)에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명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분명 유의미한 작업이긴 해도 인문 데이터의 발굴과 연구라는 전문 인문학 본연의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한계도 보인다. 일종의 응용 활동에 머무는 셈이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 연구에 얼마나 성과를 추가할 수 있을까?
 세션 토론 중인 하진 북경대학 역사학과 교수
세션 토론 중인 하진 북경대학 역사학과 교수
디지털의 폭주를 견제해야
제3세션에서는 이중원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미래 역할과 과제–포스트 휴먼과 관계의 인문학을 위하여’를, 맹만 중앙민족대 역사문화대학 교수가 ‘活泼泼地(활발발지):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역할과 가치’를 발표했다. 이중원 교수는 로크와 흄 등 경험론자의 논의를 바탕에 두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이 인공지능(로봇)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추론하며, 빅데이터로 인해 인공지능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관계적 자율성’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추측한다. 그런데 인간의 몸과 뇌는 인공지능의 논리 회로와 많은 점에서 아주 다르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존재적 지위를 논하면서 로크적인 의미의 인격성을 지닌(혹은 가능한) 존재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개와 그렇지 않은 인공지능 간의 차이가 논의에서 간과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맹만 교수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답을 주지만 삶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책을 찾아주지만 양심을 확립하게 해주지 못한다. 또한 사실 이해를 돕지만 독자적인 견해를 내게 해주지는 못하며, 나아가 애틋한 마음을 갖게 해주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얼마간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인문학 상을 바탕에 깔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기술 발전에 넋 놓고 끌려간 것이 인문학일진대, 과연 주장한 내용을 인문학이 어떻게 실현하도록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사는 어떠셨나요?
이 기사에 공감하신다면 ‘공감’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독자 여러분께 더 나은 읽을거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